책쓰기의 시작은 ‘주제’다
2016년, 영국의 언론인이자 전직 정치 컨설턴트였던 마이클 바버는 세계 각국의 교육 개혁 사례를 분석하는 책을 쓰기 위해 집필을 시작했다. 그는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의 변화를 조망하는 책을 쓰려 했지만, 원고는 몇 달 동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자료는 넘쳤고 아이디어도 많았지만,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집필 중단을 선언하고 런던 근교의 작은 별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과 중심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학생의 창의성을 억압하는가’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제를 확정하자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집필이 진행되었고, 결국 그는 《Instruction to Deliver》라는 책을 통해 교육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제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책을 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주제’이다. 주제는 단순히 어떤 이야기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책 전체를 하나의 강으로 흐르게 만드는 수원이며, 작가가 독자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이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글은 방향성을 잃고, 독자도 무엇을 읽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책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 주제’를 선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를 설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집필 전 과정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물음이다. 예컨대, “이 책을 다 읽은 독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가지길 원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 책의 주제는 이미 절반은 완성된 셈이다.
좋은 주제는 명료하면서도 책 전체를 통일성 있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중혁 작가는 자신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를 쓸 때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자 각각의 에세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었다. 쓰다 보면 이야기가 옆으로 새고, 다른 주제로 튈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다시금 중심 주제로 돌아오면 글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한편, 주제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범위가 넓은 주제는 오히려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사랑’이나 ‘행복’처럼 범용적인 단어는 책 한 권을 이끌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대신 ‘이별 후 다시 사랑을 믿기까지의 시간’처럼 보다 명확하고 상황 중심의 주제가 더 강한 전달력을 가진다. 실제로 일본의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키친』이라는 소설에서 ‘죽음을 겪은 후 사람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는가’라는 구체적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이 명확한 주제가 있었기에 짧은 분량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었다.
마이클 바버가 겪었던 혼란은 많은 예비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벽이다. 소재가 많다고 해서 좋은 책이 되지 않으며, 자료가 풍부하다고 해서 설득력이 강해지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흐름, 즉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주제가 명확할수록 글은 길을 잃지 않고 독자의 마음을 향해 정확히 나아갈 수 있다. 책을 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묻는 일이다. 그 답이 바로 책의 시작이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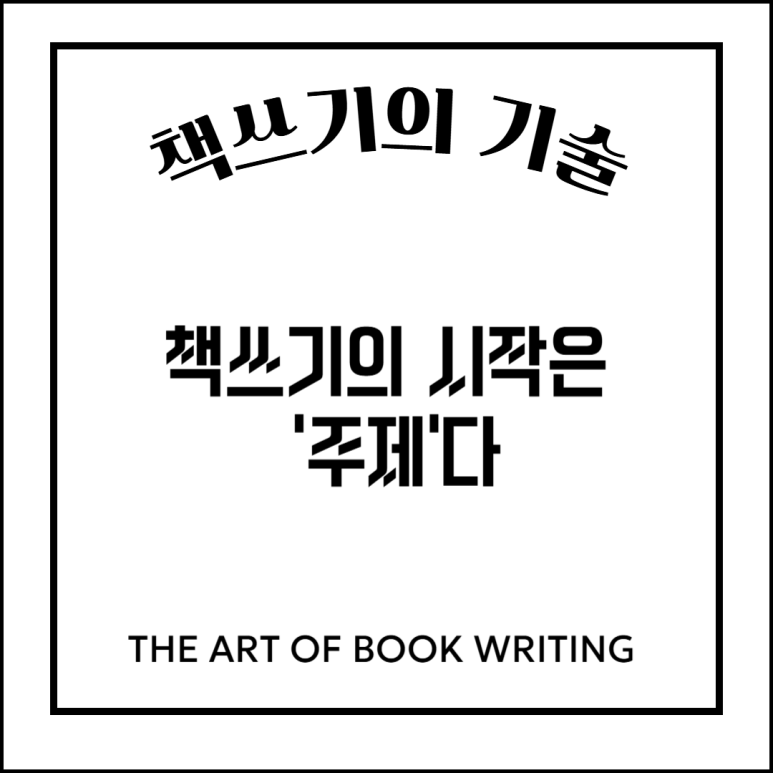
#책쓰기팁 #주제정하기 #책의흐름잡기 #작가되기 #글쓰기전략 #비전있는집필 #원고기획법 #책쓰기과정 #저자되는법 #책집필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