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독자가 글을 읽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작가들이 이 중요한 원칙을 간과한 채 어려운 단어를 남발하곤 한다. 과연 난해한 표현이 글을 더 돋보이게 만들까? 오히려 독자와의 거리만 벌어질 뿐이다. 쉬운 단어를 사용한 글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링컨 대통령은 연설의 명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여러 연설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은 단 27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연설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단히 간결하고 쉽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짜여 있지만, 그 울림은 깊고 강렬하다. 반면, 같은 시대의 정치인들이 사용한 연설문을 살펴보면, 화려한 수식과 어려운 단어로 가득 차 있어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국, 링컨의 연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명료한 언어가 주는 힘 덕분이다.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이 지적인 글을 만드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글쓰기의 목적은 독자가 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는 독자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는 단순한 가독성 문제를 넘어 독자가 글을 읽는 재미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글쓴이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결국, 독자가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쓴이의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 한다. 만약 그가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복사 균형의 변화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하면, 대중 중 상당수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반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가 더워진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쉬운 단어를 사용하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글을 유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깊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누구인지 고려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라면 더욱더 쉬운 단어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라면 다소 어려운 용어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글쓰기 방식이 아니다.
결국,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어렵고 화려한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링컨이 간결한 언어로 감동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쉬운 단어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야 한다.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다.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글은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어렵고 난해한 표현을 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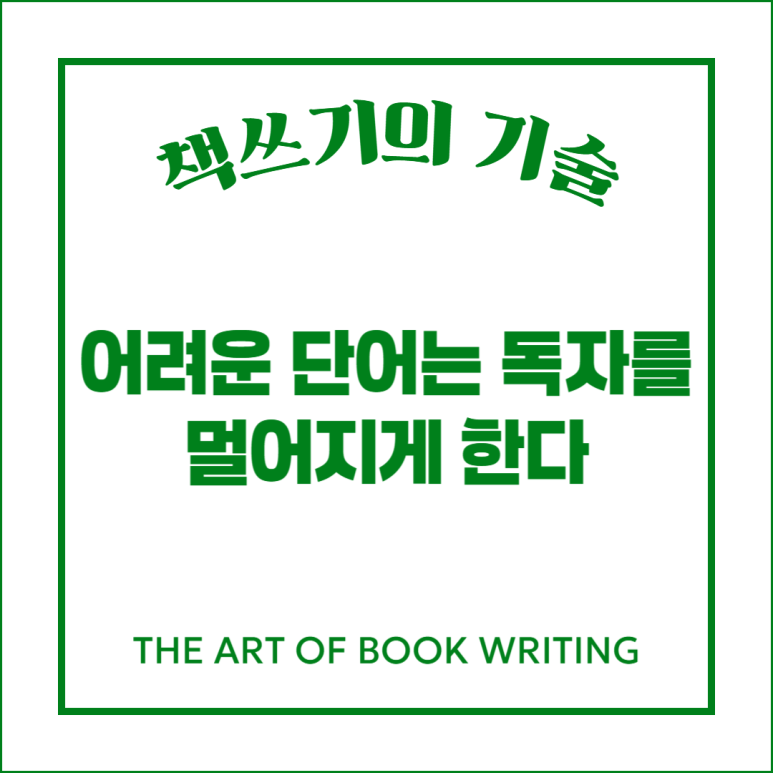
#글쓰기팁 #쉬운글쓰기 #독자중심글쓰기 #명확한문장 #쉬운언어 #독자의이해 #좋은글쓰기 #읽기쉬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