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조안 디디온(Joan Didion)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뒤 자신의 슬픔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루의 감정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시작된 이 기록은 나중에 《슬픔에 대하여》(The Year of Magical Thinking)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 책은 단순한 일기 이상의 깊이를 가지며, 그녀의 삶과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연결 짓는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조안 디디온의 사례는 글쓰기와 책쓰기가 어떻게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단순히 생각을 적는 행위와, 그것을 구조화된 이야기로 엮어 독자에게 전하는 과정은 분명 다른 차원의 작업이다.
글쓰기와 책쓰기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구조에 있다. 글쓰기는 개인적인 표현의 도구로, 때로는 감정을 쏟아내거나 순간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책쓰기는 독자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작업이다.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치밀한 계획과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안 디디온이 노트에 적은 글은 처음에는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록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들여 문장을 다듬고, 자신의 경험을 더 큰 주제—상실과 치유—로 확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쓰는 것을 넘어, 독자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차이는 구체적인 예에서도 드러난다. 2015년, 영국의 작가 힐러리 맨텔(Hilary Mantel)은 역사 소설 《울프 홀》(Wolf Hall)을 완성하기 전 수년간 자료를 조사하고 메모를 쌓아갔다. 그녀의 메모는 그 자체로 훌륭한 글쓰기였지만, 책으로 엮이기 전까지는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했다. 맨텔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동기를 깊이 파고들고, 역사적 사건을 생생한 이야기로 재구성하며, 독자가 몰입할 수 있는 서사를 완성했다. 글쓰기가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캔버스라면, 책쓰기는 그 캔버스를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인 셈이다.
또 다른 근거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에 있다. 글쓰기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즉흥적인 행위일 수 있다. 반면 책쓰기는 긴 호흡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쓰기 위해 매일 새벽 일정한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그는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수개월에 걸쳐 다듬고 확장하며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창조했다. 이처럼 책쓰기는 단순히 쓰는 행위를 넘어, 지속적인 수정과 재구성을 통해 깊이와 일관성을 더하는 과정이다.
조안 디디온의 노트는 그녀의 슬픔을 담은 솔직한 글이었지만, 그것이 《슬픔에 대하여》로 거듭난 것은 그녀가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책쓰기의 영역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개인적인 기록을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시켰고, 그 과정에서 구조와 의도를 더했다. 글쓰기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여정이라면, 책쓰기는 그 목소리를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결국 이 두 행위는 서로를 보완하며 작가의 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디디온처럼, 우리도 일상의 글쓰기를 시작으로 책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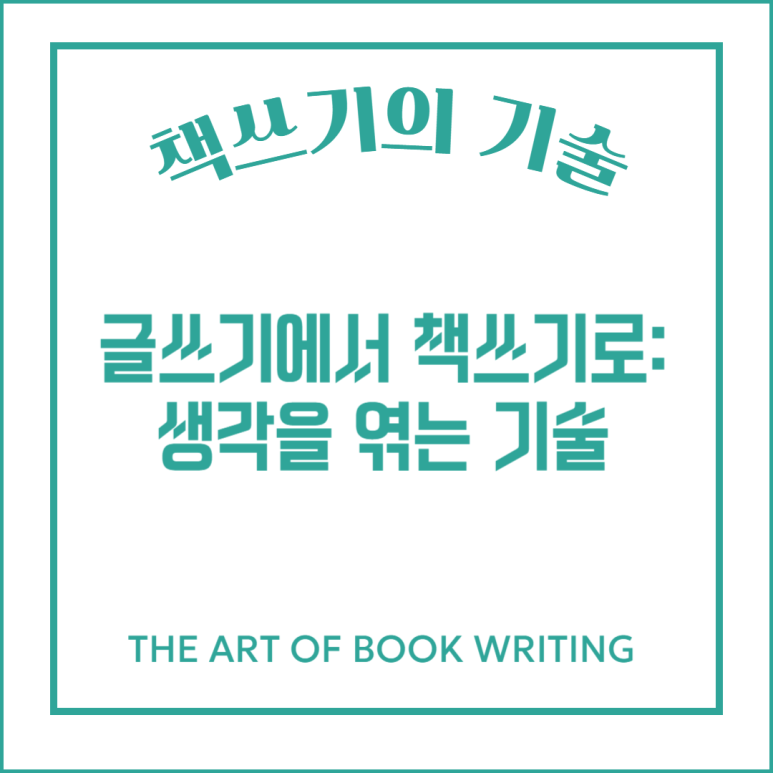
#글쓰기 #책쓰기 #작가의길 #창작과정 #글쓰기와책쓰기의차이 #조안디디온 #창의적글쓰기 #책만들기 #작가의습관 #문학적여정 #글쓰기의힘 #책으로가는길 #작가되기 #창작의비밀 #글과책의다리
'책쓰기의 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먼저 제목을 잡아야 할 이유 (0) | 2025.04.01 |
|---|---|
| 혼자 쓸까, 함께 쓸까? 책쓰기 방식의 결정 (0) | 2025.03.31 |
| 왜 나는 책을 쓰는가 (0) | 2025.03.28 |
| 일상 속에서 글감 수집하기 (0) | 2025.03.27 |
| 쉽게 쓰는 글이 진짜 힘 있는 글이다 (1) | 2025.03.25 |



